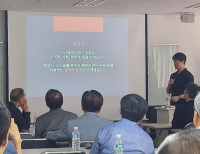최원대
최원대

윤리란 무엇일까.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에 대한 기준이다.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인간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한다.
우리는 흔히 윤리를 ‘당연한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고, 윤리도 마찬가지다. 윤리 또한 시대와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윤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절대적 윤리와 상대적 윤리. 절대적 윤리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적용되는 윤리다.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
이런 명제들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공통의 기준으로 작동한다. 윤리학에서는 이를 보편적 가치, 혹은 정언명령이라고 부른다. 칸트의 이론처럼,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 그 자체가 옳다면 그것은 무조건 수행되어야 할 도덕적 명령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전쟁 상황에서도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는 국제법상 ‘전쟁 범죄’로 규정된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고, 생명 존중은 예외 없이 존중되어야 할 가치로 여겨진다. 이런 기준들이 절대적 윤리의 대표적인 예다.
반면 상대적 윤리는 시대와 사회,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가족 구조, 성 역할, 예절, 복장 규범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서는 여성의 미덕으로 ‘삼종지도(三從之道)’, ‘일부종사(一夫從事)’가 강조되었다. 결혼 전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규범이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명백한 차별이고 부도덕한 관념이지만 그 시절에는 당연한 윤리로 받아들여졌고, 의심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노비 제도는 어떤가. 인간을 소유물처럼 사고파는 반인권적인 제도가 당시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 구조의 일부로 여겨졌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 윤리는 이렇듯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진리처럼 여기는 윤리가 절대적인지. 또한 영원한지,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이건 정말 옳은가?”
“그 옳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옳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윤리는 확신하는 순간 멈춰버린다. 질문이 멈춘 자리엔 권력이 자리 잡기 쉽다. ‘그게 옳은 거야’, ‘원래 그런 거야’라는 말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윤리는 준엄한 정의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옳은 건 아니다. 윤리는 확신이 아니라 성찰 위에 놓일 때 비로소 건강해진다.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물어야 한다. 지금 내 판단은 절대적인가, 아니면 시대의 산물인가.
그 질문을 품는 태도야말로 윤리를 윤리답게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이다.